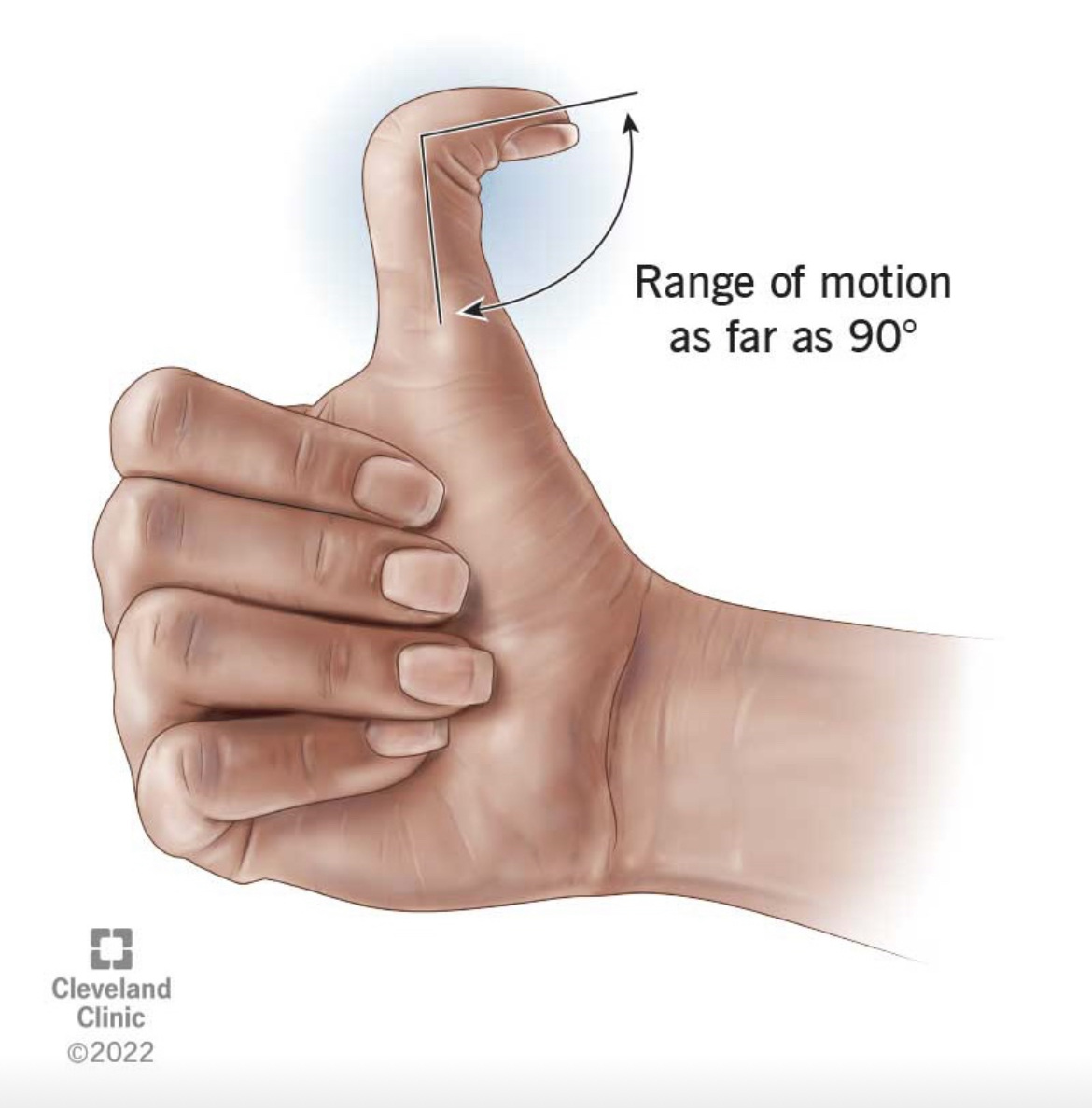
엄지쾌락
WEBZINE
WEDITOR 남예령
발달한 정보의 속도가 대중의 감각을 마비시켜 버렸다. 사회는 더 빠르고 강한 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겼고, 드로몰로지 속 경쟁을 통해 우리는 더욱 짧은 시간에 많은 쾌락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엄지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 도래한 지는 한참이다. 눈을 뜬 것도 감은 것도 아닌, 미디어에 의한 식물인간 상태에서 눈앞에 무수히 많은 프레임이 지나쳐 가는 가운데 멍하니 앉아 이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
Z세대의 주의 집중 시간은 1초.
5개의 화면을 동시에 다룰 수 있으며 집중력의 지속 시간은 8초 정도다.
정확한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변화된 환경이 한 세대를 망쳐놓은 듯하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는 간식처럼,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스낵 컬처 속 바삐 움직이는 것은 엄지손가락밖에 없다. 수용자들은 눈이 벌게질 때까지 스와이핑하고 코멘트를 남기며, 창작자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 줄 아는 숏 폼 콘텐츠들을 대량 생산해 낸다. 무의미한 동작들이 챌린지라는 명목하에 많은 이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창작자라는 명목하에 단순 모방이 만연하게 허용된다.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개인이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엄지 쾌락을 몸소 즐기고 있는 나 역시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 시장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인간 군상을 간파하였는지 매 순간 실감한다. 보다 보면 기가 찰 정도로 재미있는 밈들이 많은 건 사실이나...
바이럴을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이는 점진적으로 더 어린 연령층들의 눈길을 끈다. 자연스레 엄지 쾌락을 일찍부터 접한 현세대의 유희거리인 저급한 온라인 문화가 형성된다. (절대 내가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대표자 증 달고 연예인 영상이나 찍는다고 욕먹어서 익명 인터넷 문화가 저급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직관적이고 단순하며 근시안적인 사고가 빠르게 재생산되고 있고, 알고리즘의 높은 기여로 본인의 것과 비슷한 견해들만을 선택적으로 제공받는 탓에 이러한 현상은 날로 가속화된다.
하물며 사랑은 어떠한가. 코로나 시대는 이 보수적인 한국에서도 인만추(인터넷 만남 추구)가 공고히 자리 잡도록 일조했다. 일정 수준의 스펙 인증 절차 후 매끄럽게 진행되는 자체적 매칭 시스템, 무수한 스와이핑, 그리고 익명 대화. 손가락만으로 하나의 관계가 생긴다. 아직까진 이용 연령대가 높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데이팅 앱 광고를 보아하니 이것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는 있구나 싶다. 데이팅 목적의 앱이 아니더라도 “너가 태그한 애 마음에 드는데 소개 좀”이나, “스토리에 올라온 애 여친 있냐?”와 같은 대화들이 오가는 온라인 시대. 사람들은 각자의 작은 세계관 안에서 사랑이란 이름을 붙인 무언가를 열심히 일구어 나가고 있다.
아날로그로의 회귀를 원한다.
똑같은 엄지 쾌락의 생을 즐기면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글을 쓰냐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원래 모든 인간은 자기 모순성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당착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미디어 과잉 상태인 나에게서 벗어날 목적으로 디지털 기기 없이 관념적 대화만 존재하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이때는 디지털 디톡스를 일종의 템플 스테이라 여겼고 돌이켜보아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나 이틀을 보낸 후 폰을 켜보니 카오틱한 상황이 펼쳐져서 다시 도전해 보진 않았다. 각설하고, 정도는 다르겠으나 다수의 현대인은 모순 속에서 아날로그를 추구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이 순간을 즐겨 달라고 말한 박재상 씨는 불과 몇 분 후 자신이 찍은 영상을 정각에 SNS에 올리겠노라 말하며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순간을 즐기라는 말에 코웃음 치는 사람들과 대단한 말을 들은 것 마냥 환호하는 사람들. 리그램, 태그, 좋아요.
나라는 개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보내는 텍스트가 아닌 한두 달에 몇 번 받는 편지에 훨씬 많은 의미를 두어 왔었다. 편지와 꽃다발, 편지와 드라이브, 편지와 파인다이닝. 후자의 영향도 무시할 순 없었지만,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글에는 형용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엄지 쾌락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기술 발전의 산물 없이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부터 비롯하였다. 연애 관계를 바탕으로 한 남녀 간의 사랑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 예찬론자가 아닌 내가 사람 간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가시적인 엄지 쾌락 때문에 소중한 존재들과 의미 있는 순간들을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한 회의감에서 기인하였다. 불가역적인 자본주의와 디지털 홍수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Z세대의 주의 집중 시간은 1초.
5개의 화면을 동시에 다룰 수 있으며 집중력의 지속 시간은 8초 정도다.
정확한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변화된 환경이 한 세대를 망쳐놓은 듯하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는 간식처럼,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스낵 컬처 속 바삐 움직이는 것은 엄지손가락밖에 없다. 수용자들은 눈이 벌게질 때까지 스와이핑하고 코멘트를 남기며, 창작자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 줄 아는 숏 폼 콘텐츠들을 대량 생산해 낸다. 무의미한 동작들이 챌린지라는 명목하에 많은 이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창작자라는 명목하에 단순 모방이 만연하게 허용된다.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개인이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엄지 쾌락을 몸소 즐기고 있는 나 역시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 시장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인간 군상을 간파하였는지 매 순간 실감한다. 보다 보면 기가 찰 정도로 재미있는 밈들이 많은 건 사실이나...
바이럴을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이는 점진적으로 더 어린 연령층들의 눈길을 끈다. 자연스레 엄지 쾌락을 일찍부터 접한 현세대의 유희거리인 저급한 온라인 문화가 형성된다. (절대 내가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대표자 증 달고 연예인 영상이나 찍는다고 욕먹어서 익명 인터넷 문화가 저급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직관적이고 단순하며 근시안적인 사고가 빠르게 재생산되고 있고, 알고리즘의 높은 기여로 본인의 것과 비슷한 견해들만을 선택적으로 제공받는 탓에 이러한 현상은 날로 가속화된다.
하물며 사랑은 어떠한가. 코로나 시대는 이 보수적인 한국에서도 인만추(인터넷 만남 추구)가 공고히 자리 잡도록 일조했다. 일정 수준의 스펙 인증 절차 후 매끄럽게 진행되는 자체적 매칭 시스템, 무수한 스와이핑, 그리고 익명 대화. 손가락만으로 하나의 관계가 생긴다. 아직까진 이용 연령대가 높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데이팅 앱 광고를 보아하니 이것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는 있구나 싶다. 데이팅 목적의 앱이 아니더라도 “너가 태그한 애 마음에 드는데 소개 좀”이나, “스토리에 올라온 애 여친 있냐?”와 같은 대화들이 오가는 온라인 시대. 사람들은 각자의 작은 세계관 안에서 사랑이란 이름을 붙인 무언가를 열심히 일구어 나가고 있다.
아날로그로의 회귀를 원한다.
똑같은 엄지 쾌락의 생을 즐기면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글을 쓰냐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원래 모든 인간은 자기 모순성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당착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미디어 과잉 상태인 나에게서 벗어날 목적으로 디지털 기기 없이 관념적 대화만 존재하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이때는 디지털 디톡스를 일종의 템플 스테이라 여겼고 돌이켜보아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나 이틀을 보낸 후 폰을 켜보니 카오틱한 상황이 펼쳐져서 다시 도전해 보진 않았다. 각설하고, 정도는 다르겠으나 다수의 현대인은 모순 속에서 아날로그를 추구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이 순간을 즐겨 달라고 말한 박재상 씨는 불과 몇 분 후 자신이 찍은 영상을 정각에 SNS에 올리겠노라 말하며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순간을 즐기라는 말에 코웃음 치는 사람들과 대단한 말을 들은 것 마냥 환호하는 사람들. 리그램, 태그, 좋아요.
나라는 개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보내는 텍스트가 아닌 한두 달에 몇 번 받는 편지에 훨씬 많은 의미를 두어 왔었다. 편지와 꽃다발, 편지와 드라이브, 편지와 파인다이닝. 후자의 영향도 무시할 순 없었지만,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글에는 형용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엄지 쾌락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기술 발전의 산물 없이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부터 비롯하였다. 연애 관계를 바탕으로 한 남녀 간의 사랑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 예찬론자가 아닌 내가 사람 간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가시적인 엄지 쾌락 때문에 소중한 존재들과 의미 있는 순간들을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한 회의감에서 기인하였다. 불가역적인 자본주의와 디지털 홍수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